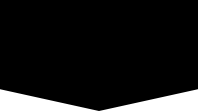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3년 부서 회식에 참석했다가 '봉변'을 당했다.
만취한 동료 여직원 B씨를 집에 바래다 줬다가 준강간상해 혐의로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이다.
A씨는 몇 달뒤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A씨의 불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측도 역시 A씨가 구속되자마자 곧바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 처분을 의결한 것이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할 기회를 갖기는커녕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조차 통보받지 못했다.
구치소에 있는 A씨에게 날아온 것은 '구성원에 대한 성폭력·성추행'이라는 이유가 담긴 '징계처분통지서'가 전부였다.
A씨에게 씌워진 누명은 해가 바뀌고 나서야 법원에 의해 겨우 벗겨졌다.
1·2심 재판부 모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그러자 A씨는 "사측이 내린 징계면직 처분 역시 무효"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민사 재판부도 A씨의 '억울함'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A씨가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측은 A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고 출석이나 진술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며 "해고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A씨가 구속돼 징계위원회에 사실상 출석이 불가능했다 해도 서면 진술이나 노동조합 대표 출석·진술은 가능했다"며 "출석이 불가능하다 해서 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