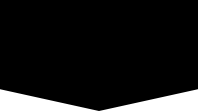‘학교 앞 문방구’는 40대 이상 세대에겐 유년시절의 기억을 지배하는 특별한 공간이다. 지금이야 스마트폰, 게임, 인터넷 등 손만 뻗으면 ‘중독’을 걱정해야할 재미거리들이 널려있지만, 당시만 해도 아이들이 일용할 만한 놀이거리가 그리 많진 않았다.
그 갈증을 해소해주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문방구였다. 수업이 끝나자마자 문방구 앞으로 직행하는 것은 초등학생들의 필수 일과였다. 달고나 등 불량식품을 하나씩 입에 물고 삼삼오오 쪼그려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새로 나온 딱지, 뽑기, 구슬, 완구들을 구경하곤 했다. 혹 엄마가 ‘곗돈’이라도 타서 값비싼 로봇장난감 하나라도 손에 넣는 ‘행운’을 누리게 되면 며칠간 머리는 악당들을 찾아 우주공간을 누비곤 했다. 그 시절 문방구는 꿈이 영그는 공장이었다.
사춘기 시절 이성에 눈을 뜨게 해준 것도 문방구였다. 책받침 속에서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들. 피비 케이츠나 소피 마르소의 미소에 전국의 중·고생은 열병을 앓았다(개인적으로는 국내파로, ‘사랑이 꽃피는 나무’의 헤로인 최수지를 가장 좋아했다.) ‘나만의’ 그녀 사진을 구하기 위해 이 동네, 저 동네 문방구를 순례하는 수고로움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문방구를 통해 소년은 한 마리의 ‘수컷’으로 성장해갔다.
아련한 추억의 장소 문방구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말 문구소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서다. 아직 일부 갈등이 남아있지만 대형마트는 2014년 문구품목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을 축소해야 한다. 또 학용문구 매장규모를 축소하고 신학기 학용문구 할인행사를 자제하며 묶음단위로 판매하는 등 규제를 받는다.
이 같은 뉴스를 접한 주변의 반응은 대개 이렇다. “마트에서 공책 등 학용품을 묶음 단위로만 팔도록 규제하는 게 시장논리에 맞나” “경쟁을 통해 물건을 싸게 팔게 하는 것이 소비자에겐 유리한 것 아닌가” 등이다. 한 마디로 중기적합업종은 반시장적이며, 반소비자적이라는 주장이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인데 정말 그럴까. 시장경제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은 ‘독과점’이다. 학교 앞 문방구들이 하나둘 사라져 결국 소수 대형 기업이 문구시장을 쥐락펴락한다면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리 없다. 독과점기업들이 폭리를 취해도 소비자들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비싼 물건을 사야 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나라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경제검찰 조직을 두고 독과점을 엄격히 규제하는 이유다.
실제로 동네 문방구들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문방구 수는 1999년 2만6986개에서 2012년 1만4731개로 45%나 감소했다. 학생수의 감소, 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있지만, 대형마트의 문구류 판매도 문방구 감소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명절에 우연히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 그때 그 시절의 문방구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추억을 도둑 맞은 듯한 기분을 느낀 사람도 적지 않다.
비단 적합업종뿐 아니라 대다수 중소기업 정책은 불편하다. 경제도 어려운 마당에 조그만 중소기업이나 영세상인들을 살리자고 국가대표격인 대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다. 또 흔히 하는 비유로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류현진 선수가 전국체전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거나 피겨여왕 김연아가 1등을 차지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
숲은 몇 그루의 커다란 나무로만 이뤄질 수 없다. 아름드리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풀도, 심지어 잡초도 있어야 건강한 숲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숲이 오래간다. 지금 당장은 불편해도 시장의 작고 힘없는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