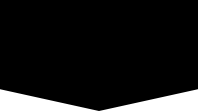중동호흡기증후군(이하 메르스)으로 사망한 76번 환자 A씨는 지난 6일 건국대병원 응급실에 온 뒤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적 있느냐는 의사의 질문에 "그런적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달 27일~28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A씨로부터의 감염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건국대병원 같은 병실 보호자와 강동경희대병원 응급실 레지던트, 구급차 운전기사와 구급요원 등이 줄줄이 감염됐다.
메르스로 사망한 98번 환자 B씨는 이대목동병원에서 확진판정을 받기 전 병원 3곳에서 치료를 받았다. 뒤늦게 B씨의 확진 여부를 파악한 양천구 측은 지난 10일 브리핑을 통해 "확진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사실을 말하지 않아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B씨가 다녀간 양천구 메디힐병원은 79명이 입원해있는 등 감염우려가 커졌고, 이에 시는 오는 23일까지 봉쇄조치를 내렸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자신이 진료를 봤던 메르스 위험 병원 등의 정보를 숨겨 감염이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메르스 감염을 막기 위해선 환자 동선과 접촉자의 빠른 파악이 필수적이지만, 환자가 숨기는 변수 탓에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은 것. 이로 인해 메르스 감염자가 늘기도 하고 병원 봉쇄나 지역사회 불안으로 번졌다.
하지만 환자 개인의 양심에 맡겨진 부분이라 별다른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메르스로 낙인찍히는 것은 물론 생활고 등 어려움을 겪을 것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메르스 확진 및 의심환자들이 숨기는 사례는 다양하나 감염이 대거 발생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방문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대다수였다.
C씨(83)는 심장병 증상이 심해져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5일 퇴원 후 자택격리됐다. 이후 14일 어지럼증이 심해 타 병원을 찾았으나 그의 보호자 D씨는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던 사실을 숨겼다. 김 씨는 "병원에서 진료를 거부할까 두려웠다"고 털어놨다.
대구지역 첫 감염자인 E씨(52)는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 받은 모친을 병문안 한 뒤 감염됐지만 격리대상에서 빠졌다. 대구시는 E씨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갔단 사실을 숨겨 사전파악이 안됐다고 밝혔다. 그는 정상 출근했을 뿐 아니라 구청직원들과 회식까지 해 지역사회의 공분을 샀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감염 환자로 낙인찍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전우영 충남대 심리학과 교수는 "메르스란 진단 또는 의심을 받는 게 두려운 것"이라며 "주위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이 걱정돼 숨기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도 "메르스 확진자란 낙인을 찍고 너와 나는 다르다며 배제시키는 것에 대해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환자들이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연구와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전 교수는 "사소한 증상도 스스로 알리는 것이 자신과 그 주변을 보호하는 것이란 걸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분들이 피해받지 않고 격리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메르스 환자의 심리나 인식에 대한 부분도 역학 조사를 통해 연구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가 세심하게 환자의 안전을 보호 하는 법적 부분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