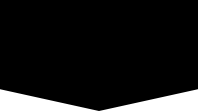과연, 이영돈 PD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지난 2월 1일부터 방영 중인 JTBC [이영돈 PD가 간다]를 보며 드는 생각이다. 첫 화에서 미제 유괴사건인 故 이형호 군 사건을 이야기하던 프로그램은 이후 스스로 전파무기 피해자라 주장하는 사람들의 믿기 어려운 사연부터 역술인 능력 검증, 혈관성 치매로 매일같이 아내에게 청혼하는 남자의 이야기까지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기 어려운 소재들을 다루고 있다. 소재로만 따지면 KBS [추적 60분]부터 SBS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KBS [인간극장]을 오가는 수준이다.
종횡무진 하는 아이템들을 하나로 묶어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포맷이 아닌 이영돈이라는 스타 PD의 이름값이다. KBS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이나 채널A [이영돈 PD의 먹거리 X파일](이하 [먹거리 X파일])도 그의 이름을 앞에 걸되 이영돈 PD가 ‘무엇을’ 하느냐에 방점이 찍혔다면, 이번 [이영돈 PD가 간다]는 무엇을 하든 어디로 가든 이영돈 PD가 한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 제목이다. 탐사보도의 달인인 그가 현장으로 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성과도 있다. 방송에서 ‘고라니 사건’이라 명명한 미제 뺑소니 사건은 용의자를 검거했으며, 바이칼 호 여행이 꿈인 부부를 위한 여행 경비도 마련해줬다. 비교적 잘 맞추는 무속인과 사기꾼도 감별해냈다. 현장에서의 그는 무엇이든 해결하는 해결사에 가깝다. 방송을 보며 종종 후련함을 느끼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시사 프로그램으로서 [이영돈 PD가 간다]는 그 후련함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의문을 남긴다.
이영돈 PD는 자신의 책 [이영돈 PD의 TV프로그램 기획 제작론]에서 ‘탐사보도의 궁극적 목적은 정책 의제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영돈 PD가 간다] 기획 의도에도 ‘좋은 사회가 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과 아젠다를 제시한다’가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그는 우리나라에서 의제 형성을 가장 잘하는 언론인 중 하나다. 신동엽을 통해 패러디된 [먹거리 X파일]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라는 대사는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고 문제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에 능통한 대가의 테크닉이었다. 나도 좋아하고 당신도 좋아하는 이 음식, 과연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은 섹시하다. 반응도 즉각적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바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그의 사명감은 종종 무언가를 끄집어내 공론화하는 것을 넘어,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판결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MSG 사용 식당에 대한 집요한 추적과 비판은 그의 치적인 동시에 오명의 근거가 되었다. FDA가 인정했듯 MSG 자체는 유해하지 않지만 방송에 나온 것처럼 조미료 국물을 마치 오래 고아 만든 육수처럼 선전해 이득을 취하는 냉면집은 부도덕한 게 맞다. MSG를 이용해 질 낮은 식재료의 문제를 감출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여기서 이영돈 PD는 어떤 경우에는 써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다양한 맥락을 전달하기보다는 MSG를 안 쓰는 식당에 ‘착한 식당’이라는 칭호를 붙이는 것으로 MSG는 나쁜 것, 안 쓰는 건 착한 것으로 구도를 단순화했다. 그편이 훨씬 직관적이며, MSG의 부도덕한 사용을 막기에도 훨씬 효과적이다. 하지만 과연 시청자가 MSG에 대한 오해 없는 진실에 접근했는지는 의문이다. 이영돈 PD는 논의를 생산하기보다는 논의를 종결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과 자신의 언론인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재밌는 건, 이처럼 판결하고 해결하는 사람으로서의 이영돈 PD의 이미지를 숨김없이 전면에 내세운 [이영돈 PD가 간다]에 이르러 오히려 프로그램의 사회적 의제 형성 기능이 떨어졌다는 사실이다. 본인이 경험한 정신분열증 환자와는 느낌이 다르다며 전파무기 피해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던 ‘전파가 나를 공격한다’ 편에서는 결국 그들은 자칭 피해자이자 정신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동조현상 확산을 막자는, 꼭 심리학자가 아니더라도 이야기할 만한 맥 빠지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미제 뺑소니 사건을 다룬 ‘크림빵과 고라니’에선 ‘크림빵’ 키워드가 뺑소니 사건 해결에 박차를 가한 것처럼 다른 미제 사건도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느냐며 일종의 실험을 제안하는 듯 진행하지만, 실질적으로 사건은 실험과는 무관하게 경찰의 수사로 해결됐다. 남는 것은 의제나 메시지가 아닌, 현장에서 동분서주 뛰는 이영돈 PD의 역동적인 이미지다.
시사 프로그램으로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던 그의 전작들은 해당 사안의 맥락을 최대한 단순화한 뒤 대중의 공분을 이끌어내 의제를 선점했다. 하지만 대중에게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남기지 않는 메시지는 결과적으로 매체와 해당 언론인의 입김을 강화할 뿐 사회 전반이 참여하는 공론장은 오히려 약화시킨다. 그가 수여하는 ‘착한 식당’의 간판은 상당한 효력을 발휘하겠지만, 과연 여기에 탈락한 식당들이 부도덕한 것이냐, 이것을 그저 식당 주인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환원하는 게 맞느냐는 여러 맥락의 논의는 활성화되지 않는다. 사회적 협의와 이해의 과정을 동반하지 않는 의제 형성은 그 직접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반의 계몽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이것이 극대화돼 언론이 현장에서 직접 모든 걸 판단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자처하는 순간, 사회적 공론장과의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끊어지며, 오직 슈퍼히어로 같은 언론인의 활약상만이 남는다. 그래서 다시, 과연 이영돈 PD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질문은 그 스스로에게도 필요해 보인다. 어디로든 너무 멀리 가기 전에.
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