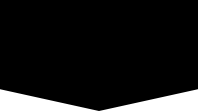[레알? 사이언스톡]대형 포유류 상당수 멸종 위기… "고립 생태계에선 '대형화' 이뤄져"

flickr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봐도,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본다"라는 말이 있다. 사람의 경우에는 자신보다 큰 사람의 품에 들면 그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빠르게 성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지만, 나무는 다르다. 광합성을 하며 살아가는 나무의 경우에는 큰 나무의 그늘 밑에 들게 되면 빛을 제대로 받지 못해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성장이 더뎌지고, 거미줄처럼 뻗어있는 큰 나무의 뿌리에 가로막혀 물과 무기질의 흡수도 방해받으니 제대로 생존하기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큰 나무 그늘에 갇힌 작은 나무는 영양분의 부족과 햇빛에 대한 갈망으로 심하게 줄기가 휘어지거나, 잔가지들을 산지사방으로 뻗어내는 초라한 모양새를 띄기 마련이다.
하지만 작은 나무라고 끝까지 작은 것만은 아니다. 목재를 탐낸 나무꾼이 큰 나무를 베어내어 그늘을 제거해주면, 작은 나무들은 숨통을 틔우고 다시 하늘을 향해 쑥쑥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생태계의 모든 생물들은 한정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면서 살아간다. 자원을 확보하면, 즉, 먹잇감을 충분히 확보한 개체는 원활한 영향 공급으로 덩치가 커지게 되고, 커진 덩치는 그 자체로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는 유리한 요소가 된다. 이는 육식동물뿐 아니라 초식동물에게도 해당된다.
코끼리는 비록 초식동물이지만 다 자라면 사자조차도 함부로 사냥하러 덤비지 못하는 무적의 존재가 된다. 5톤에 달하는 코끼리의 커다란 덩치와 그 육체가 가진 물리적 힘이 훌륭한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분한 먹잇감만 확보할 수 있다면, 개체의 진화는 덩치가 커지는 쪽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 전략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 바로 공룡이다.
2억 2500만 년 전, 트라이아스 후기에 처음 지구상에 등장한 공룡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아마도 현대인이 이 시절의 공룡을 처음 맞닥뜨린다면, 긴 꼬리를 가진 털 없는 닭을 닮았다고 생각했으리라. 공룡이 등장하기 전에도 이미 파충류는 있었으나, 공룡은 도마뱀이나 악어와 같은 파충류에 비해서 확실한 생존 이점이 있었다. 그 건 바로 다리의 구조였다.
보통 파충류의 다리는 몸통과 수평한 구조에서 뻗어 나오므로, 몸을 떠받칠 수 없기에 상대적으로 이동 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공룡의 경우, 다리가 몸통과 수직을 이루어 몸통을 떠받치기에 이동이 용이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두 개의 뒷다리로 일어서서 빠르게 달리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이동상의 장점은 고만고만한 동물들만 존재하던 고생대 생태계에서는 엄청나게 유리했다.
또 풍부한 먹이와 산소량, 조류의 특징을 지닌 공룡의 폐는 대기 중 산소를 빨아들이는데 훨씬 유리했다. 이런 다양한 생태적 유리함은 공룡을 이후 2억년이 넘는 기간 동안 생태계 지배자로 군림하게 하는 원인이 됐고, 공룡은 이를 바탕으로 엄청나게 큰 덩치를 가지는 방향으로 진화한 바 있다.
육식공룡이었던 티라노사우르스는 몸길이 13m에 몸무게 6톤의 거대한 사냥꾼이었으며, 이름마저도 어마어마한 슈퍼사우루스는 몸길이만 42m에 55톤의 몸무게를 지닌 그야말로 산더미 같은 생물체로 자라났다.
하지만 모든 개체들이 이 전략을 이용할 수는 없다. 이미 덩치가 큰 경쟁자들이 우위를 선점하고 있거나 혹은 덩치 경쟁에서 밀려난 경우, 그 틈바구니에 낀 개체들은 오히려 덩치가 작아지는 방향으로 진화한다.
일단 커다란 몸집은 많은 양의 먹이를 필요로 하기에 먹잇감을 충분히 구할 수 없는 개체들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몸집이 작아지면 몸을 숨기기도 쉬워져 덩치 큰 개체들의 사나운 눈초리를 피하기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초기의 포유류다.
포유류의 특징을 일부 가진 원시 포유류인 파충류형 포유류 시노그나투스(Cynognatchus)는 공룡과 비슷한 2억 25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했고, 몸 크기도 여우만 했다.
하지만 생존경쟁에서 우위권을 쥔 공룡이 생태계의 제왕으로 군림하게 되면서 점점 커지는 공룡들의 틈바구니에서 덩치가 큰 개체들은 고스란히 이들의 먹잇감이 됐고, 1억 8000만 년 경에 지구상에 남은 파충류형 포유류는 쥐 정도의 크기의 개체만이 남게 된다. 그리고 살아남은 이 개체들은 더 이상 파충류형 포유류가 아닌 완벽한 포유류의 특징-항온, 털가죽, 수유, 새끼 보호 등-으로 변모돼 있었다.
포유류는 파충류에 비해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새끼들의 생존율도 높아서 개체수도 어렵지 않게 증가했지만, 이들 역시도 덩치에서 밀리는 공룡들의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했기에 큰 덩치를 갖지는 못했다.
쥐 크기의 포유류들이 몸집을 불릴 기회를 잡은 것은 6500만 년 경, 공룡이 멸종된 이후였다. 큰 나무가 베어지면 그 밑에서 기를 펴지 못했던 작은 나무들이 경쟁하며 자라나듯 공룡이 멸종해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생태계에서 가장 먼저 승기를 잡았던 것은 다름 아닌 포유류였던 것이다.
이들의 몸속에서 수억 년 동안이나 잠자고 있던 '크기에 대한 열망'은 매머드(몸무게 9톤)와 마스토톤(몸무게 6톤)으로 이어졌다.
쥐의 조상 중 하나인 포베로미스 패터르소니(Phoberomys pattersoni)는 이들에겐 못 미치지만, 몸 길이 2.5m에 무게는 700kg에 달하는 거대한 덩치로 자라났다. 공룡 대신 번성하기 시작한 포유류는 곧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덩치 경쟁을 이어나갔다.
코끼리나 코뿔소, 기린과 같은 개체들은 점점 덩치를 키워 생존의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는 형태로 변모했고, 이 틈바구니에 끼인 쥐를 비롯한 설치류들은 좁은 공간에서 천적의 눈에 덜 띠는 형태로 작아지는 전략을 구사하면서 이들 종간 개체 차이는 점점 벌어지기 시작했다.
현재의 쥐가 작다고 해서 미래의 쥐 역시도 작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쥐가 작아진 것은 환경과 맞물린 적응의 결과이지, 쥐는 무조건 작아야 한다는 숙명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 어쩌면 대형 포유류들의 상당수가 멸종 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은 오히려 쥐에게 있어서는 예전의 영광을 되찾는 기회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이에 영국 레스터대 얀 잘라시에비치(Jan Zalasiewicz) 교수는 고립된 생태계에서는 특히나 쥐들이 생태계의 새로운 주인의 위치를 차지하고 이에 따른 보상 급부로 대형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주장한다.
쥐는 거의 모든 것을 먹는 잡식성 중에서도 최고의 식성을 자랑하는 무편식주의자이기 때문에 먹잇감의 범위가 넓고, 번식력이 강하다는 특징을 지닌다. 쥐의 일종인 생쥐의 경우, 생후 30일이면 성적 성숙이 일어나며, 임신 3주 만에 6~12마리의 새끼를 한꺼번에 낳을 수 있고, 출산 후 21일이면 수유기간이 끝나기에 다시 임신이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번식력을 가진다.
쥐의 이 엄청난 번식력은 쥐를 잡아먹고 사는 천적들에게 풍부한 먹잇감이 되는 동시에, 천적이 없는 경우 쥐가 생태계의 우위를 단숨에 독점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렇게 된다면 과거 공룡이 사라진 자리를 차지한 포유류들이 자체 경쟁을 벌여 대형화됐듯, 천적이 사라진 생태계에서 쥐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거인증을 가진 쥐가 출현할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그리고 이는 현재 진행형이다. 잘라시에비치 교수는 고립된 생태계, 즉 외따로 떨어져 오랫동안 독자적 생태계를 이루었던 작은 섬에 사람들이 이주하면서, 이와 함께 들어온 쥐들이 기존의 생태 균형을 깨뜨리고 새로운 지배자가 된 사례, 즉 '쥐의 섬'에 대한 사례들을 다수 제시했다.
또한 최근 영국과 스웨덴 등에서는 몸길이 40cm가 넘는 거대쥐가 자주 출몰해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일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과연 지구 생태계의 미래는 마이티마우스(Minghty mouse)가 지배하는 쥐들의 천국이 될 것인가? 정확한 답은 먼 훗날이나 답할 수 있을 테지만, 지금처럼 대형 포유류의 멸종이 가속화된다면 그에 비례해 이 가능성은 더 커질 것만은 분명하다.
※본 콘텐츠 저작권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과학향기(scent.ndsl.kr/index.d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