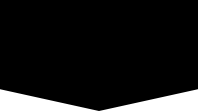정부가 ‘메르스 발병 지역·병원 비공개’를 기본원칙으로 세운 것에 대해 법률전문가들은 관련법을 근거로 우려를 표시했다.
5일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모아보면, 현재 보건당국의 대처는 '국가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권리와 보건권을 지켜줄 의무'를 저버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감염병예방법)에는 ‘국가는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의 의무가 있고 국민은 감염병의 발생상황,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현 사태에 비춰 관련법을 좀 더 엄격하게 해석해 정부가 정보 공개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발병 지역과 병원이 공개될 경우 주민들의 공포가 확산되고 병원에 불필요한 낙인이 찍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지만, 유언비어와 허위사실이 급격하게 퍼지고 있는 현 사태가 불러올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진녕 변호사는 “국민의 알권리 및 보건권과 병원의 영업권이 충돌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황에선 전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병원이 공개됐을 때 손실보상의 문제가 발생해 국가로서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지만 이를 이유로 국민의 알권리와 보건권이 침해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영업권 손해에 대한 보상에서 발생하는 비용보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다.
법무법인 동화의 이재정 변호사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확산되면서 생기는 사회적 폐해와 부작용이 크다”며 “관련법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법 해석 또한 기본적·상식적 차원에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현재 국민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떠도는 유언비어로 불안감에 떨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가 법 해석을 엄격하게 해 정확한 정보전달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당국은 지난달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확인된 이후 발병 지역과 관련 병원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주민들의 공포 확산과 해당 병원에 찍힐 낙인을 우려해서다.
다만 보건당국은 5일 메르스 감염이 집중적으로 일어났던 평택성모병원의 실명을 발표하며, 앞으로도 이 병원처럼 확진자가 많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름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