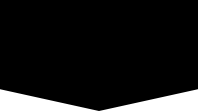▲국립공주병원 전경/자료=보건복지부
"정신병원 하면 떠오르는 쇠창살이 우리 병원에는 거의 없습니다. 환자들이 원할 때는 언제든 스스로 나와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인권적으로 봐도, 치료성과로 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는 4월4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지난달 31일 찾은 국립공주병원의 이영문 원장은 병원을 이렇게 설명했다.
1998년 5월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병원으로 개원한 이 병원은 중부권(대전, 충청 지역) 정신건강 거점 국립의료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하루 평균 200명의 입원환자와 40명의 외래환자가 찾으며 주로 정신분열병과 양극성장애, 알코올중독,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는다.
직접 둘러본 국립공주병원은 정신병원에 대한 보편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창문을 가리는 쇠창살이 없어 병원 내부는 밝은 분위기였고 환자들이 직접 그린 그림과 직접 쓴 글귀가 병원 곳곳에 장식돼 있었다.
병원 밖 운동장이나 '치유의 숲' 산책길에는 환자들이 자유롭게 나와 산책을 했다. 일부는 시설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는 모습도 보였다. 환자들이 바깥 사회와 같은 환경을 많이 접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치료 받는 것이 조기 치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최근 민간 정신병원들도 시설 등에서 개선이 많이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용중심의 치료를 하고 있다"며 "우리 병원은 '자유가 치료'라는 원칙에 따라 시설과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고 했다.
병원 안에 설치된 어울림카페와 농원, 매점, 비누 공방 등은 모두 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에 활용되고 있다. 환자들이 카페에서 직접 커피를 만들며 퇴원 전 바깥세상을 간접 체험하는 것이다.
데이케어 프로그램 역시 신경을 많이 썼다. 2개월 정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퇴원을 앞둔 입원 환자나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동물 보조 치유활동과 합창, 심리극 등을 진행한다.
정신질환 외에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 비만 등이 있는 환자들은 협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립공주병원과 같이 정신질환자들이 편견 없이 자유롭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설은 많지 않은 편이다.
이 원장은 "국립병원 시설이 전체 정신과 시설의 상위 10% 안에 든다"며 "대형 병원들은 점차 늘고 있지만 정신과는 돈이 안돼서 투자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시설 뿐 아니라 제도적 여건 역시 녹록치 않다. 국내 18세 이상 성인 중 평생 한번 이상 정신질환을 경험한 사람은 519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 전문의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람은 15.3%에 불과하다. 미국(39.2%), 호주(34.9%)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3년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바꾸고 가벼운 정신질환은 각종 정신질환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2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신질환에 관한 필요성은 모두 인정하지만 타 법안에 비해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인식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격한 경제성장, 학업에 대한 압박 등으로 인한 자살, 중독 문제 등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법률을 전면 개정해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차별받는 사람도 줄이고 정신건강의 개념을 바꿔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정신질환자들의 사회 적응을 위해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역할이 중요한데 이들의 숫자가 국가 규모로 봤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며 "재활 대상인 사람의 경우 조기에 개입해야 입원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