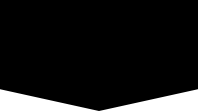#현금자동입출금기(ATM) 마감이나 시재금(은행이 보유한 현금) 정산 때 돈이 남거나 모자란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①내 돈으로 채워넣는다. ②지점장·책임자와 상의해 모자란 금액을 공동 분담한다. ③마감을 미루더라도 부족하거나 남는 금액의 원인을 끝까지 찾아낸다. |
'바늘구멍'이라는 은행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면접에 앞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위기대응' 질문이다. 정답은 ③. 시재금의 구멍은 절대 개인의 돈으로 메우려 하면 안 된다. 오차의 원인을 찾아내야 하고, 시재금을 맞출 때까지 퇴근이란 없다. 실제로 대부분의 은행원들은 99.9% 원인을 찾아 해결한다.
그러나 0.1%의 '구멍'은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의 현실적 대응은 정답과는 거리가 멀다. 금액이 남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모자란 경우에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구멍을 메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거액의 환전 사고를 낸 A은행 직원도 사비를 털었다. 그는 한화 500만원을 6000싱가포르 달러로 환전하려던 고객에게 6만 싱가포르 달러로 내준 후 마감 과정에서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러나 고객이 '돈을 많이 받았는지 몰랐다', '돈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해, 우선 사비로 금액을 메운 것으로 전해졌다. 차액 5만4000달러는 한화로 4300만원이 넘는 거액이다. "반드시 돈을 되찾을 것"이라며 직원 스스로 선택한 해결책이지만, 사건이 '진실공방' 양상으로 접어들면서 주변에선 안타까워 하고 있다.
일선 은행원들에게 A은행의 사례는 '남일'이 아니다. 수백원 또는 수천원이 모자라 사비로 메우는 경우는 '한 번쯤은 경험해 본 일'이고, 울며 겨자먹기로 거액을 토해 낸 경험담도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B은행 직원의 사례는 이렇다. "영업 마감 직후 1000만원 가까운 금액의 송금을 위해 찾아온 고객의 일을 처리하다, 정산하려고 꺼내뒀던 현금 100만원 한 뭉치가 섞여 송금됐다. CCTV를 통해 실을 확인했지만, 고객은 '몰랐다'고 주장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비용과 시간 때문에 소송을 포기했고 100만원 구멍도 사비로 채웠다. 명백한 내 과실이지만, 문제의 원인이 확인돼도 돈을 찾을 수는 없었다"
C은행 한 직원은 "업무상 과실로 수천만원의 사고를 낸 후 사비를 털어 구멍을 메운 후 내 일터로 자부심을 가지고 일했는데 사고의 책임을 모조리 개인에게 모는 '상사와 회사에 실망했다'며 은행을 떠났다"는 동료의 사연을 들려주기도 했다.
이 같은 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시중은행들은 직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금액을 메울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있다. 또 거액의 사고 금액을 메워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저금리 대출 제도를 운영하는 은행도 있다. 순간의 실수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는 직원들을 위한 대안이다.
그러나 보험이나 대출 제도 활용을 위해선 본부에 공식 보고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결국 사고 기록이 향후 승진·고과 등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은행원들은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비를 들여 '표나지 않게' 구멍을 메우는 사례가 흔하다는 설명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 과실로 발생한 구멍을 책임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매일 천문학적인 금액을 다루면서 거액의 금융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을 오롯이 개인에게 지우는 관행은 다소 억울한 일"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사실 '시재금은 맞을 수밖에 없고,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원칙은 행원들에겐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은행의 입장에서는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경계하는 까닭에 '시재금 원칙'이 사라지기는 어려워 보인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