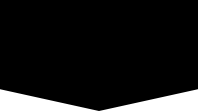이 이야기는 황당할 수도 있다. 정의감에 불타는 형사 안드레아스(니콜라이 코스터 왈도)는 전과자인 트리스탄(니콜라이 리 카스)의 집에서 쓰레기 더미에 방치된 아기 소푸스를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는다.
얼마 후, 아들 알렉산더를 한밤중에 잃은 안드레아스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려 하지만, 아내의 극구 반대로 묘책을 떠올린다. 바로 죽은 알렉산더와 살아있는 소푸스를 바꾸는 것이다.
이런 결정이 가능했던 건 도덕에 대한 형사의 인식이 남다르기 때문. 트리스탄의 가정은 깨지기 일보 직전이다. 남편은 마약에 찌든 데다 아내에게 주먹질을 수시로 해대며, 똥·오줌이 범벅된 아기를 장롱 한 구석에 처박아두는 막장 인생의 전형이다. 이를 본 형사가 “감옥에 넣어야한다”며 남편과 가족의 분리를 주장하지만, ‘법의 논리’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한다.
형사가 자신의 아들을 잃고 문득 든 생각은 깨질 위기에 처한 자신의 가정을 차선책으로 보상받고 이미 깨진 다른 가정을 최소한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아들 바꾸기’라는 것. 죽은 아들로 두 가정이 모두 값비싼 고통을 치르느니, 자신의 양심 한 조각 덜어내고 취한 악한 행동이 모두의 상처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선’을 얻기 위해 ‘악’을 행해야하는 역설적 상황에서 안드레아스는 피해의 대상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악 그 자체가 지닌 모습을 단죄해야하는가.
영화는 끊임없이 도덕적 딜레마를 둘러싸고 분노와 고통, 용서와 양심이라는 이중적 가치를 날카롭게 들이댄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란 말은 이 영화에서 통용되지 않는다. 영원할 것 같은 인간의 행복은 어느 순간 불행으로 90도 하강 곡선을 그릴 수도 있고, 남들이 갖는 보편적 도덕심을 아무 거리낌 없이 내팽개칠 수도 있다.
그것은 모두 ‘선’이라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위해 선택해야하는 ‘악’의 설득화 과정이기도 하다. 나쁜 짓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런 건 모두 다 잘되기 위해서야’라고 스스로의 양심에 면책을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리스탄의 입장에서 안드레아스의 ‘선’은 ‘악’일 뿐이다. 잘못은 안드레아스가 했는데 ‘선’을 외치고, 트리스탄은 아무 잘못 없이 ‘악’의 대상이 되었다. 갑자기 아기를 ‘죽인’ 죄인의 누명을 뒤집어 쓴 트리스탄은 위악의 흔적을 없애기 위해 더 큰 ‘악의 유혹’에 빠진다.
도덕은 그것을 오랫동안 지켜온 이들에겐 ‘명찰’이다. 한번 붙은 명찰은 떼기도 더럽히기도 어렵다. 그러니 잘 우기면 저버린 양심도 금세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양심을 밥 먹듯 잃어버린 사람에게 도덕은 한번 이탈로 모든 죄를 뒤집어써야할지 모른다.
영화는 묻는다. 모두가 ‘윈윈’하기위해 ‘선’을 획득한 자가 최소한의 ‘악’을 행해도 되는지, 그리고 이미 ‘악’으로 규정된 이들은 또 다른 ‘악’을 받아들일 만큼 ‘선’을 허용받지 못한 사람들인지 말이다.
영화 속 두 부부는 모두 ‘두번째 기회’를 갖고 있다. 그 기회를 어떻게 쓸지는 모두 선악과 관련된 판단의 문제다. 우리는 과연 선악의 가치를 올바른 잣대로 사용하고 있을까.
지난 2011년 ‘인 어 베러 월드’로 아카데미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최우수 외국어상을 받은 여성 감독 수잔 비에르의 작품이다. 11일 개봉. 청소년 관람불가.
머니투데이